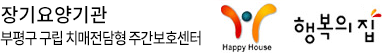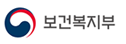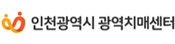치매는 상식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평행복의집 작성일 21-02-02 08:40본문
얼마 전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지인에게서 책을 한 권 받았다. 2018년 개봉한 같은 이름의 영화를 소재로 펴낸 <엄마의 공책>이다.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기억의 레시피’라는 부제가 보여주듯 이 책은 치매 가이드북이라고 할 수 있다. 책을 보내준 유경 어르신사랑연구모임 대표와 이성희 한국치매가족협회 회장이 함께 만든 것이다. 치매 부모를 돌본 두 사람의 생생한 경험담도 녹아 있어 ‘실전 대응 매뉴얼’에 가깝다.
노후생활에 접어들기 시작한 5060세대에게 치매 대비는 먼 훗날의 과제가 아니다. 당장 여든이나 아흔쯤 되는 노부모의 정신건강부터 챙겨보지 않을 수 없다. 치매 지식이 전혀 없으면서 노부모의 인지기능 이상을 제때 알아차리거나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하기는 쉽지 않다. 노부모든 자신이든 치매에 걸린 뒤 치러야 할 대가를 생각해보면 ‘치매 공부’는 시급한 숙제라고 하겠다.
■ 건망증과 치매 사이
중견기업 P부장은 지방에 사는 80대 후반 노모와 통화할 때마다 유심히 관찰한다. 노모 말투가 심하게 어눌해지지 않았는지, 단어 사용이나 문장 구성 등이 너무 엉망이 되지 않았는지 등. 노모와 함께 사는 여동생 가족을 통해 일상생활에 이상한 구석이 없는지도 당연히 살핀다.
한국인 치매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치매는 20년 안팎으로 서서히 진행된다. 그런 만큼 평소 예방에 신경 쓰는 것과 더불어 이상이 생겼을 때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 시점이 늦을수록 치매가 급속히 악화하거나 난폭한 양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
그동안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알츠하이머는 뇌 속에 베타아밀로이드 같은 단백질 찌꺼기가 쌓이거나 타우단백질에 이상이 생겨 발병한다. 이들 물질로 뇌의 신경섬유가 병들고, 죽은 세포가 늘어나면서 뇌 기능이 떨어진다. 기억에 적잖은 문제가 생기는 경도인지장애를 거쳐 치매로 변해간다. 유전적 요인이 20%, 잘못된 식생활 습관 등 후천적 요인이 8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그나마 다행이다. 잘 대비하면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뜻이므로.
특히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의 조기 포착이 중요하다. 이 시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발병은 시간문제다. ‘치매 예비군’으로 불리는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10~15%가 매년 치매 환자로 바뀐다고 한다. 2016년 국내 역학조사에 따르면,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160만 명이 넘는다. 65살 이상 고령자 다섯 명 가운데 한 명꼴이다.
경도인지장애는 정상적인 건망증과 질병인 치매의 중간 단계다. 본인은 여러 가지 작은 이상을 분명히 느끼지만, 주변에서는 알아차리기 힘든 시기다. 이때는 본인 스스로 치매 가능성을 의심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쉽사리 입 밖에 내지 못한다. ‘설마 아니겠지’ 하는 기대심리와 ‘혹시라도 치매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어서다. 설령 치매 증상이 뚜렷해도 좀체 수긍하려 들지 않는다. 주변에서 갸웃거려도 자존심 때문에 잡아떼기 일쑤다.
그러다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치매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 본인이 나서 진단검사를 받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치매의 조기 발견과 후속 대응이 쉬워진다. 이전과 달리 기억, 시공간 인식, 판단 등이 흐릿해지면 주저하지 말고 중앙치매협회나 보건소 등 의료기관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좋다. 노부모의 인지기능에 이상 조짐이 보인다면 검사받도록 꾸준히 설득할 필요가 있다. 치매의 원인과 종류, 진행 과정, 증상, 검사법 등 ‘치매의 모든 것’은 중앙치매센터 누리집(nid.or.kr)에 상세하게 나와 있다.
■ 기다림의 이유
정도와 관계없이 인지장애라는 진단이 나오면 ‘돌봄 체제’를 서두르는 게 바람직하다. 노부모의 기억력과 사고력이 거의 나아지지 않을 것이므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병의 악화를 멈추거나 늦추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치매라고 해서 흔히 말하듯 모두가 ‘벽에 똥칠하는’ 최악의 증상을 보이는 것이 아니다. 치매 대응 체제에는 생활습관·환경 개선을 포함한 돌봄과 약물을 통한 치료, 두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
치매는 거주 환경 변화에 민감하다. 낯익은 곳에서 친숙한 사람이 돌보는 것이 최선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병세가 깊어지는 치매의 특성에 비춰, 노부모 상태를 지속해서 지켜볼 수 있는 주보호자를 두도록 <엄마의 공책>은 권한다. 주보호자는 늘 곁에서 돌보는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을 말한다. 물론 가족이 논의해 돌봄 부담을 동등하게 지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
치매 돌봄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기다림이다. 아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만 도와야 한다. 돌보는 사람이 답답하다고 이것저것 다 해줘버리면 환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잔존기능)까지 못하게 된다. 자칫 학대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또 마땅히 돌볼 사람이 없을 때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의 신세를 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환자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해 돌봄 환경의 장단점을 신중하게 따져보는 게 바람직하다.
약물치료는 전문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다만 대부분의 치매는 현대의학으로 완치되지 않기 때문에 좀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개발된 치매 처방약은 치매 원인물질을 제거하지 못한다. 대신 인지기능을 개선해주는 아세틸콜린의 분해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이다.
치매약은 뇌신경에 영향을 주는 만큼 부작용도 적지 않다. 배회, 폭언, 공격 등 환자의 문제행동(BPSD)을 제어하기 위해 쓰는 향정신성 약물의 부작용은 더 심하다. 오랫동안 치매환자를 진료해온 일본 동네의사 나가오 가즈히로는 저서 <치매와 싸우지 마세요>에서 “치매약을 한 알만 줄여도 딴사람처럼 건강이 회복되는 사례를 많이 봤다”며 잘못된 처방과 돌봄이 치매를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현재로선 치매 근치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발병 시기와 증상 악화를 최대한 늦추면 한결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다. 그 시작은 치매 공부다. 나도 예외가 아니다. 치매 공부를 해두면 불행하게도 자신이 ‘치매 궤도’에 올라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로 알게 된다. 치매환자나 그 가족을 보는 눈도 한결 따뜻해진다.
parkje@hani.co.kr
노후생활에 접어들기 시작한 5060세대에게 치매 대비는 먼 훗날의 과제가 아니다. 당장 여든이나 아흔쯤 되는 노부모의 정신건강부터 챙겨보지 않을 수 없다. 치매 지식이 전혀 없으면서 노부모의 인지기능 이상을 제때 알아차리거나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하기는 쉽지 않다. 노부모든 자신이든 치매에 걸린 뒤 치러야 할 대가를 생각해보면 ‘치매 공부’는 시급한 숙제라고 하겠다.
■ 건망증과 치매 사이
중견기업 P부장은 지방에 사는 80대 후반 노모와 통화할 때마다 유심히 관찰한다. 노모 말투가 심하게 어눌해지지 않았는지, 단어 사용이나 문장 구성 등이 너무 엉망이 되지 않았는지 등. 노모와 함께 사는 여동생 가족을 통해 일상생활에 이상한 구석이 없는지도 당연히 살핀다.
한국인 치매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치매는 20년 안팎으로 서서히 진행된다. 그런 만큼 평소 예방에 신경 쓰는 것과 더불어 이상이 생겼을 때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 시점이 늦을수록 치매가 급속히 악화하거나 난폭한 양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
그동안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알츠하이머는 뇌 속에 베타아밀로이드 같은 단백질 찌꺼기가 쌓이거나 타우단백질에 이상이 생겨 발병한다. 이들 물질로 뇌의 신경섬유가 병들고, 죽은 세포가 늘어나면서 뇌 기능이 떨어진다. 기억에 적잖은 문제가 생기는 경도인지장애를 거쳐 치매로 변해간다. 유전적 요인이 20%, 잘못된 식생활 습관 등 후천적 요인이 8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그나마 다행이다. 잘 대비하면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뜻이므로.
특히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의 조기 포착이 중요하다. 이 시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발병은 시간문제다. ‘치매 예비군’으로 불리는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10~15%가 매년 치매 환자로 바뀐다고 한다. 2016년 국내 역학조사에 따르면,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160만 명이 넘는다. 65살 이상 고령자 다섯 명 가운데 한 명꼴이다.
경도인지장애는 정상적인 건망증과 질병인 치매의 중간 단계다. 본인은 여러 가지 작은 이상을 분명히 느끼지만, 주변에서는 알아차리기 힘든 시기다. 이때는 본인 스스로 치매 가능성을 의심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쉽사리 입 밖에 내지 못한다. ‘설마 아니겠지’ 하는 기대심리와 ‘혹시라도 치매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어서다. 설령 치매 증상이 뚜렷해도 좀체 수긍하려 들지 않는다. 주변에서 갸웃거려도 자존심 때문에 잡아떼기 일쑤다.
그러다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치매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 본인이 나서 진단검사를 받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치매의 조기 발견과 후속 대응이 쉬워진다. 이전과 달리 기억, 시공간 인식, 판단 등이 흐릿해지면 주저하지 말고 중앙치매협회나 보건소 등 의료기관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좋다. 노부모의 인지기능에 이상 조짐이 보인다면 검사받도록 꾸준히 설득할 필요가 있다. 치매의 원인과 종류, 진행 과정, 증상, 검사법 등 ‘치매의 모든 것’은 중앙치매센터 누리집(nid.or.kr)에 상세하게 나와 있다.
■ 기다림의 이유
정도와 관계없이 인지장애라는 진단이 나오면 ‘돌봄 체제’를 서두르는 게 바람직하다. 노부모의 기억력과 사고력이 거의 나아지지 않을 것이므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병의 악화를 멈추거나 늦추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치매라고 해서 흔히 말하듯 모두가 ‘벽에 똥칠하는’ 최악의 증상을 보이는 것이 아니다. 치매 대응 체제에는 생활습관·환경 개선을 포함한 돌봄과 약물을 통한 치료, 두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
치매는 거주 환경 변화에 민감하다. 낯익은 곳에서 친숙한 사람이 돌보는 것이 최선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병세가 깊어지는 치매의 특성에 비춰, 노부모 상태를 지속해서 지켜볼 수 있는 주보호자를 두도록 <엄마의 공책>은 권한다. 주보호자는 늘 곁에서 돌보는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을 말한다. 물론 가족이 논의해 돌봄 부담을 동등하게 지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
치매 돌봄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기다림이다. 아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만 도와야 한다. 돌보는 사람이 답답하다고 이것저것 다 해줘버리면 환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잔존기능)까지 못하게 된다. 자칫 학대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또 마땅히 돌볼 사람이 없을 때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의 신세를 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환자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해 돌봄 환경의 장단점을 신중하게 따져보는 게 바람직하다.
약물치료는 전문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다만 대부분의 치매는 현대의학으로 완치되지 않기 때문에 좀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개발된 치매 처방약은 치매 원인물질을 제거하지 못한다. 대신 인지기능을 개선해주는 아세틸콜린의 분해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이다.
치매약은 뇌신경에 영향을 주는 만큼 부작용도 적지 않다. 배회, 폭언, 공격 등 환자의 문제행동(BPSD)을 제어하기 위해 쓰는 향정신성 약물의 부작용은 더 심하다. 오랫동안 치매환자를 진료해온 일본 동네의사 나가오 가즈히로는 저서 <치매와 싸우지 마세요>에서 “치매약을 한 알만 줄여도 딴사람처럼 건강이 회복되는 사례를 많이 봤다”며 잘못된 처방과 돌봄이 치매를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현재로선 치매 근치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발병 시기와 증상 악화를 최대한 늦추면 한결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다. 그 시작은 치매 공부다. 나도 예외가 아니다. 치매 공부를 해두면 불행하게도 자신이 ‘치매 궤도’에 올라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로 알게 된다. 치매환자나 그 가족을 보는 눈도 한결 따뜻해진다.
parkje@hani.co.kr
- 이전글우울하고 불안한 사람… 치매 '3년' 일찍 옵니다 21.02.26
- 다음글환각, 망상, 집착… 증상들 알아야 '치매' 보살필 수 있다 21.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