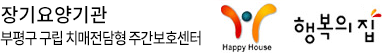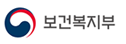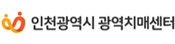생활 속에서 치매를 늦추는 방법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10-20 11:24본문
현재로선 치매를 완치할 치료제가 없다. 그러나 치매가 오는 시기를 늦출 방법은 있다. 우선 치매 위험인자를 알고 이를 최대한 피해야 한다. 치매 위험인자는 △음주(2.2배) △흡연(1.6배) △뇌 손상(2.4배) △우울증(1.7배) △고혈압(1.6배) △당뇨병(1.5배) △비만(1.6배) △운동 부족(1.8배) 등이다. 생선·채소·과일·우유를 자주 섭취하는 식습관과 낱말 맞히기, 편지 쓰기, 독서·영화나 공연 관람으로 뇌를 자극하는 생활습관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최근 학계가 강조하는 치매 늦추는 방법은 ‘땀내며 운동하기’다.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연구팀은 65~90세 188명(정상인 107명, 경도인지장애인 81명)을 대상으로 운동과 치매 관계를 분석했다. 중년기(40~64세)에 걷기를 시작한 그룹은 노년기(65세 이상)에 걷기를 시작한 그룹보다 전반적인 인지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땀이 나고 호흡이 가빠질 정도(고강도)로 걸으면 인지 저하를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결론이다. 중앙치매센터는 20분 이상 고강도 운동을 주 3회 할 것을 권고한다. 만일 고강도 운동을 하기 어렵다면 중간 정도의 운동을 30분 정도 주 5회 하면 된다.
운동이 어떻게 치매를 늦추는 것일까. 최근 국제 학술지(뉴런)를 통해 보고된 연구 결과에서 그 이유를 엿볼 수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종합병원 유전·노화연구실 연구팀은 운동할 때 근육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아이리신)이 알츠하이머를 예방한다고 밝혔다. 이 호르몬은 알츠하이머를 초래하는 아밀로이드-베타와 타우 단백질을 제거한다.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셈이다.
치매 고위험군이 인지 감퇴를 느낄 땐 치매 의심
평소 이렇게 건강한 생활을 하다가도 기억력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 치매를 의심하게 된다. 일시적으로 무언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건망증이다. 치매는 계산을 못 하거나, 매일 걷던 길을 헤매거나, 음식을 조리하다가 불을 끄는 것을 잊거나, 조금 전에 했던 말을 반복하거나, 같은 질문을 되풀이하는 등 예전과 다른 증상을 보인다. 또 예전보다 관심과 의욕이 떨어지고 매사가 귀찮아지는 것도 초기 치매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이와 같은 증상을 알고 있어야 치매를 초기에 발견할 수 있다. 뾰족한 치료제가 없는 현실에서 초기에 치매를 발견하는 것은 예방만큼 중요하다. 예전과 다른 증상으로 치매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면 인근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를 찾아 치매선별검사를 받으면 된다. 스마트폰에서 검색하면 가장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확인할 수 있다. 60세 이상은 무료로 치매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검사에서 정상으로 판정되면 2년마다 한 번씩 검사받으면 된다. 그러나 ‘인지 저하’ 판정을 받으면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김기웅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치매 고위험군이 인지 감퇴를 느낄 때는 한 번쯤 치매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 고위험군이란 위험인자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우선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우울증·뇌 손상 등이 있는 사람이다. 배우자가 치매인 경우도 치매 위험이 크다. 부모 중에 치매가 있다면 치매 위험은 일반인의 2배다. 이런 위험인자가 있는데 인지 감퇴까지 느낀다면 치매안심센터에 가서 간이 검사를 받으면 된다. 그 검사에서 치매가 의심되면 정밀 검사로 넘어갈 수 있다. 위험인자가 없는 사람에게는 몇 세부터 치매 검사를 받으라고 하기 어렵다. 치매가 발생하는 연령 범위가 매우 넓어서다. 그래도 60세 이후부터는 정기적으로 간이 검사라도 받으면 초기에 치매를 발견하는 데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실종으로 목숨 잃는 치매 환자, 한 해 100여 명
정밀 검사에서 치매 진단이 나오면 모든 가족은 당황스럽다. 물론 환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매 치료를 받아야 한다. 가족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집 근처의 치매안심센터를 찾아 환자로 등록하는 것이다. 현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는 53만여 명으로 실제 환자 수의 절반에 불과하다. 등록된 환자는 기본적인 치매 상담과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기저귀와 물티슈 등 보조용품도 제공된다. 치료비는 연간 36만원까지 지원되는데, 환자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치매상담콜센터(전화 1899-9988)에 받을 수 있는 치료비 등 치매 관련 도움을 문의할 수 있다.
치매 환자를 가족으로 뒀을 때 가장 우려되는 점은 실종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 실종 신고 건수는 1만4527건이다.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실종 건수까지 더하면 수치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치매 환자는 인지능력과 시공간 파악 능력이 떨어져 길을 잃거나 배수로 등에 빠지기도 한다. 심지어 실종 후 목숨을 잃은 치매 환자만 연평균 100여 명이 넘는다.
실종된 치매 환자를 발견하기까지 평균 8시간이 걸린다. 이 시간을 단축하는 데 필요한 것이 ‘사전등록제도’다. 치매 환자가 실종됐을 때를 대비해 경찰 시스템에 지문과 사진 등 정보를 미리 등록해 놓는 것이다.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경찰청의 ‘안전Dream’ 앱을 내려받아 환자의 인적 사항을 등록할 수도 있다. 사전 등록된 치매 환자를 발견하는 데는 평균 54분이 소요되지만, 미등록자는 11시간 넘게 걸리기도 한다. 13배 이상 차이 나는 셈이다. 실제로 서울 양천구에서 자신의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치매 환자 A씨(86)가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전 등록 정보를 확인해 18분 만에 환자를 찾아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그러나 경찰청에 따르면 치매 환자의 사전등록률은 13.8%밖에 되지 않는다.
치매안심센터가 발급하는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부착하는 것도 실종을 예방하는 한 방법이다. 인식표에는 이름·주소·보호자 연락처를 담은 코드와 개별 고유번호가 표기돼 있다.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 환자라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주머니에 소지하거나 옷에 붙일 수도 있다.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
최근 학계가 강조하는 치매 늦추는 방법은 ‘땀내며 운동하기’다.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연구팀은 65~90세 188명(정상인 107명, 경도인지장애인 81명)을 대상으로 운동과 치매 관계를 분석했다. 중년기(40~64세)에 걷기를 시작한 그룹은 노년기(65세 이상)에 걷기를 시작한 그룹보다 전반적인 인지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땀이 나고 호흡이 가빠질 정도(고강도)로 걸으면 인지 저하를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결론이다. 중앙치매센터는 20분 이상 고강도 운동을 주 3회 할 것을 권고한다. 만일 고강도 운동을 하기 어렵다면 중간 정도의 운동을 30분 정도 주 5회 하면 된다.
운동이 어떻게 치매를 늦추는 것일까. 최근 국제 학술지(뉴런)를 통해 보고된 연구 결과에서 그 이유를 엿볼 수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종합병원 유전·노화연구실 연구팀은 운동할 때 근육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아이리신)이 알츠하이머를 예방한다고 밝혔다. 이 호르몬은 알츠하이머를 초래하는 아밀로이드-베타와 타우 단백질을 제거한다.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셈이다.
치매 고위험군이 인지 감퇴를 느낄 땐 치매 의심
평소 이렇게 건강한 생활을 하다가도 기억력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 치매를 의심하게 된다. 일시적으로 무언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건망증이다. 치매는 계산을 못 하거나, 매일 걷던 길을 헤매거나, 음식을 조리하다가 불을 끄는 것을 잊거나, 조금 전에 했던 말을 반복하거나, 같은 질문을 되풀이하는 등 예전과 다른 증상을 보인다. 또 예전보다 관심과 의욕이 떨어지고 매사가 귀찮아지는 것도 초기 치매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이와 같은 증상을 알고 있어야 치매를 초기에 발견할 수 있다. 뾰족한 치료제가 없는 현실에서 초기에 치매를 발견하는 것은 예방만큼 중요하다. 예전과 다른 증상으로 치매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면 인근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를 찾아 치매선별검사를 받으면 된다. 스마트폰에서 검색하면 가장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확인할 수 있다. 60세 이상은 무료로 치매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검사에서 정상으로 판정되면 2년마다 한 번씩 검사받으면 된다. 그러나 ‘인지 저하’ 판정을 받으면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김기웅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치매 고위험군이 인지 감퇴를 느낄 때는 한 번쯤 치매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 고위험군이란 위험인자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우선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우울증·뇌 손상 등이 있는 사람이다. 배우자가 치매인 경우도 치매 위험이 크다. 부모 중에 치매가 있다면 치매 위험은 일반인의 2배다. 이런 위험인자가 있는데 인지 감퇴까지 느낀다면 치매안심센터에 가서 간이 검사를 받으면 된다. 그 검사에서 치매가 의심되면 정밀 검사로 넘어갈 수 있다. 위험인자가 없는 사람에게는 몇 세부터 치매 검사를 받으라고 하기 어렵다. 치매가 발생하는 연령 범위가 매우 넓어서다. 그래도 60세 이후부터는 정기적으로 간이 검사라도 받으면 초기에 치매를 발견하는 데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실종으로 목숨 잃는 치매 환자, 한 해 100여 명
정밀 검사에서 치매 진단이 나오면 모든 가족은 당황스럽다. 물론 환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매 치료를 받아야 한다. 가족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집 근처의 치매안심센터를 찾아 환자로 등록하는 것이다. 현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는 53만여 명으로 실제 환자 수의 절반에 불과하다. 등록된 환자는 기본적인 치매 상담과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기저귀와 물티슈 등 보조용품도 제공된다. 치료비는 연간 36만원까지 지원되는데, 환자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치매상담콜센터(전화 1899-9988)에 받을 수 있는 치료비 등 치매 관련 도움을 문의할 수 있다.
치매 환자를 가족으로 뒀을 때 가장 우려되는 점은 실종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 실종 신고 건수는 1만4527건이다.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실종 건수까지 더하면 수치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치매 환자는 인지능력과 시공간 파악 능력이 떨어져 길을 잃거나 배수로 등에 빠지기도 한다. 심지어 실종 후 목숨을 잃은 치매 환자만 연평균 100여 명이 넘는다.
실종된 치매 환자를 발견하기까지 평균 8시간이 걸린다. 이 시간을 단축하는 데 필요한 것이 ‘사전등록제도’다. 치매 환자가 실종됐을 때를 대비해 경찰 시스템에 지문과 사진 등 정보를 미리 등록해 놓는 것이다.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경찰청의 ‘안전Dream’ 앱을 내려받아 환자의 인적 사항을 등록할 수도 있다. 사전 등록된 치매 환자를 발견하는 데는 평균 54분이 소요되지만, 미등록자는 11시간 넘게 걸리기도 한다. 13배 이상 차이 나는 셈이다. 실제로 서울 양천구에서 자신의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치매 환자 A씨(86)가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전 등록 정보를 확인해 18분 만에 환자를 찾아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그러나 경찰청에 따르면 치매 환자의 사전등록률은 13.8%밖에 되지 않는다.
치매안심센터가 발급하는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부착하는 것도 실종을 예방하는 한 방법이다. 인식표에는 이름·주소·보호자 연락처를 담은 코드와 개별 고유번호가 표기돼 있다.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 환자라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주머니에 소지하거나 옷에 붙일 수도 있다.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
- 이전글치매 예방하고 수명 연장 돕는 ‘이 과일’은? 23.10.20
- 다음글뇌-혈관 장벽 넘는 분자로 치매 잡는다 2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