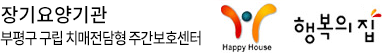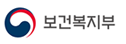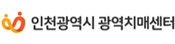반세기를 미워한 어머니와의 화해, 그 절절한 사연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평행복의집 작성일 11-02-14 13:30본문
사실 '프레시안 books' 편집 회의 때 역사학자 김기협의 시병 일기 <아흔 개의 봄>(서해문집 펴냄)이 출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그냥 그런가보다 했다.
얼마 후 우연히 김기협의 <중앙일보> 인터뷰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 나도 모르게 '앗! 이남덕 할머니' 소리가 저절로 튀어나왔다. 내 기억 속에 '멋쟁이 할머니'로 자리 잡고 있던 분이 바로 김기협의 어머니이자 <아흔 개의 봄>의 주인공이었던 것이다. 한번 읽어볼 생각으로 담당 기자에게 트위터를 날렸다. 다음 날 책을 받으려고 갔다가 덜컥 서평을 맡아버렸다.
나는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이 모두 이남덕과 같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인연으로 어린 시절부터 그를 사적으로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한복을 즐겨 입으셨고 가끔은 봇짐 배낭을 들고 나타나셨고 작은 이야기도 재미있게 풀어서 들려주셨고 자신을 '혼자 영화도 보러 다니는 씩씩한 늙은이'라고 하셨던 기억이 난다. 어린 내겐 멋지고 약간은 까칠하지만 당찬 '멋쟁이 할머니'였다. 내가 문학과 우리말에 관심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고는 당신이 지은 <한국어 어원 연구 I>(이남덕 지음,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펴냄)이 나오자마자 건네주셨던 자상한 할머니기이도 했다. 김기협도 인정했듯이 '정열'이 넘치는 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자식들 눈에는 어머니가 좀 다르게 보였던 것 같다. 김기협은 <아흔 개의 봄>에서 "수십 년 동안 그 분의 훌륭한 점보다 그 분의 모순과 위선을 더 많이 생각하며 살아왔다"고 고백하고 있다. 아마도 평범하지만은 않았던 가족사 때문이었을 것이다. 김기협이 태어날 때까지도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결혼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아버지와 전처와의 이혼 수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두 번째 아내였던 것이다. 그는 그런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고 "나는 오랫동안 진심으로 어머니를 미워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2007년 6월 김기협의 어머니 이남덕이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어머니를 한 요양 병원에 모셔놓고 매일 어머니를 찾아뵈며 지내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당시에는 여전히 "자식으로서의 도리 때문에 살펴드리는 것이지,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우러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했다"고 적고 있다. 그러던 그가 이제는 "나는 지금 어머니를 몹시 좋아하고 아낀다"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다. "어머니, 이마에다가 뽀뽀 좀 해드려도 될까요?" 하면서 능청스럽게 "엄마" 이마에 뽀뽀를 하는 효자 아들이 되었다.
어머니도 김기협이 병실에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기~협~아~ 네가 가면 난 어떡하니?" 하면서 행복한 칭얼 모드에 들어가곤 한다. 김기협은 2009년 7월 6일 시병 일기에 "이렇게 찾아뵙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고 저절로 쌓이게 되다니, 이러다가 내가 정말 효자가 돼버리는 거 아닐까?"라고 적고 있다. 그 무렵 그는 이미 어머니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효자가 되어 있었다.
<아흔 개의 봄>은 겉으로 보면 치매에 걸린 노모를 돌보며 그날그날의 일들을 적어놓은 일종의 시병 일기이다. 하지만 그 내막은 결국 김기협의 반세기에 걸친 절박한 '엄마 찾기'의 순례 과정에 대한 기록이자 자기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다. 과거의 그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분을 편안한 눈길로 바라보지 못하며 살아오려니 나 자신을 좋게 볼 수도 없고, 세상을 좋게 볼 수도 없었다"면 어머니를 사랑하게 되면서 "엄마"를 찾은 현재의 그는 "그분과의 화해가 세상과의 화해, 나 자신과의 화해를 위한 길을 열어주었다"면서 '엄마 찾기'는 '화해'의 과정이었음을 숨기지 않는다.
<아흔 개의 봄>을 읽기 시작하면서 사실 상투적인 생각이 먼저 찾아왔다. 우선 더 일찍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안타까움이었다. 그런데 금방 이렇게라도 화해하고 효도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반문해보게 되었다. 우리들 중 몇 명이나 이런 화해와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아흔 개의 봄>을 읽는 내내 솔직히 그가 부러웠고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런데 이 책의 미덕은 정작 다른 곳에 좀 비껴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먼저 <아흔 개의 봄>이 효자송이나 열녀문 시리즈가 아니어서 좋았다. 이런 종류의 글을 쓰면서 과장하지 않고 현실을 담담하게 그려냈다는 것은 큰 미덕일 것이다. 어쩌면 이 책은 미래에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실제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알려주는 실용적인 매뉴얼인 것 같다.
치매에 걸린 노모에 대처하는 상식적인 마음뿐 아니라 요양원을 선택하는 현실적인 방법과 같은 실제적인 여러 방안들이 기술되어있다. 호들갑스러운 어머니와 아들의 극적인 화해가 아니라 차츰 잔잔하게 물들어 가는 화해와 사랑이 있어서 더 실감이 났고 더 큰 동감이 갔다.
무엇보다도 치매에 걸려서 꺼져가는 한 인간의 '의식'에 대한 김기협의 연민과 존중이 <아흔 개의 봄>을 읽고 난 후 내 마음속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누구나 죽음을 피해갈 수 없고 다른 죽어가는 사람을 지켜보는 것도 피할 도리도 없다. 이 책은 왜 꺼져가는 생명 앞에서 연민으로 당당하게 마주 서야하는지 우리들에게 되묻는다. 결국 김기협의 '엄마 찾기'는 삶에 대한 연민이자 '의미 찾기'인 것이었다.
김기협의 마지막 '엄마 찾기' 작업이 진행 중이다. 법적으로 '계모'로 되어 있는 어머니를 '생모'로 돌려달라는 '친생자관계존부속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어머니에 관한 글을 다시 쓰게 될지도 모른다. 아니, 틀림없이 또 쓰게 될 거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쓰던 것과는 다른 자세로 쓰게 될 것이다. 2년간 적은 글은 어머니의 '인생 강의'를 받아쓴 노트인 셈이다. 이제 노트 필기는 접어놓고, 어머니 얼굴만 기분 좋게 쳐다보며 지내겠다. 언젠가 다음 과목 노트 필기를 시작하게 되겠지만, 서두르지는 않겠다."
이렇게 끝을 맺은 시병 일기의 속편이 나온다면 '생모 찾기' 소송의 결과부터 이야기 하면서 시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남덕 할머니는 이미 그 아들에게 스스로의 방식으로 판결을 내렸다. 2010년 9월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에게 친필로 이렇게 판결문을 적어 주었다.
"아아 나는 너에게 글을 써 주겠다. 너는 내 아들이다. 틀림이 없다. 그런데 한 번도 가까운 데서는 글을 안 써주는구나. 본래 가까운 사람은 항상 먼 데서 멀리 있는 것이로구나."
얼마 후 우연히 김기협의 <중앙일보> 인터뷰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 나도 모르게 '앗! 이남덕 할머니' 소리가 저절로 튀어나왔다. 내 기억 속에 '멋쟁이 할머니'로 자리 잡고 있던 분이 바로 김기협의 어머니이자 <아흔 개의 봄>의 주인공이었던 것이다. 한번 읽어볼 생각으로 담당 기자에게 트위터를 날렸다. 다음 날 책을 받으려고 갔다가 덜컥 서평을 맡아버렸다.
나는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이 모두 이남덕과 같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인연으로 어린 시절부터 그를 사적으로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한복을 즐겨 입으셨고 가끔은 봇짐 배낭을 들고 나타나셨고 작은 이야기도 재미있게 풀어서 들려주셨고 자신을 '혼자 영화도 보러 다니는 씩씩한 늙은이'라고 하셨던 기억이 난다. 어린 내겐 멋지고 약간은 까칠하지만 당찬 '멋쟁이 할머니'였다. 내가 문학과 우리말에 관심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고는 당신이 지은 <한국어 어원 연구 I>(이남덕 지음,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펴냄)이 나오자마자 건네주셨던 자상한 할머니기이도 했다. 김기협도 인정했듯이 '정열'이 넘치는 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
| ▲ <아흔 개의 봄>(김기협 지음, 서해문집 펴냄). ⓒ서해문집 |
2007년 6월 김기협의 어머니 이남덕이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어머니를 한 요양 병원에 모셔놓고 매일 어머니를 찾아뵈며 지내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당시에는 여전히 "자식으로서의 도리 때문에 살펴드리는 것이지,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우러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했다"고 적고 있다. 그러던 그가 이제는 "나는 지금 어머니를 몹시 좋아하고 아낀다"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다. "어머니, 이마에다가 뽀뽀 좀 해드려도 될까요?" 하면서 능청스럽게 "엄마" 이마에 뽀뽀를 하는 효자 아들이 되었다.
어머니도 김기협이 병실에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기~협~아~ 네가 가면 난 어떡하니?" 하면서 행복한 칭얼 모드에 들어가곤 한다. 김기협은 2009년 7월 6일 시병 일기에 "이렇게 찾아뵙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고 저절로 쌓이게 되다니, 이러다가 내가 정말 효자가 돼버리는 거 아닐까?"라고 적고 있다. 그 무렵 그는 이미 어머니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효자가 되어 있었다.
<아흔 개의 봄>은 겉으로 보면 치매에 걸린 노모를 돌보며 그날그날의 일들을 적어놓은 일종의 시병 일기이다. 하지만 그 내막은 결국 김기협의 반세기에 걸친 절박한 '엄마 찾기'의 순례 과정에 대한 기록이자 자기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다. 과거의 그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분을 편안한 눈길로 바라보지 못하며 살아오려니 나 자신을 좋게 볼 수도 없고, 세상을 좋게 볼 수도 없었다"면 어머니를 사랑하게 되면서 "엄마"를 찾은 현재의 그는 "그분과의 화해가 세상과의 화해, 나 자신과의 화해를 위한 길을 열어주었다"면서 '엄마 찾기'는 '화해'의 과정이었음을 숨기지 않는다.
<아흔 개의 봄>을 읽기 시작하면서 사실 상투적인 생각이 먼저 찾아왔다. 우선 더 일찍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안타까움이었다. 그런데 금방 이렇게라도 화해하고 효도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반문해보게 되었다. 우리들 중 몇 명이나 이런 화해와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아흔 개의 봄>을 읽는 내내 솔직히 그가 부러웠고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런데 이 책의 미덕은 정작 다른 곳에 좀 비껴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먼저 <아흔 개의 봄>이 효자송이나 열녀문 시리즈가 아니어서 좋았다. 이런 종류의 글을 쓰면서 과장하지 않고 현실을 담담하게 그려냈다는 것은 큰 미덕일 것이다. 어쩌면 이 책은 미래에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실제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알려주는 실용적인 매뉴얼인 것 같다.
치매에 걸린 노모에 대처하는 상식적인 마음뿐 아니라 요양원을 선택하는 현실적인 방법과 같은 실제적인 여러 방안들이 기술되어있다. 호들갑스러운 어머니와 아들의 극적인 화해가 아니라 차츰 잔잔하게 물들어 가는 화해와 사랑이 있어서 더 실감이 났고 더 큰 동감이 갔다.
무엇보다도 치매에 걸려서 꺼져가는 한 인간의 '의식'에 대한 김기협의 연민과 존중이 <아흔 개의 봄>을 읽고 난 후 내 마음속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누구나 죽음을 피해갈 수 없고 다른 죽어가는 사람을 지켜보는 것도 피할 도리도 없다. 이 책은 왜 꺼져가는 생명 앞에서 연민으로 당당하게 마주 서야하는지 우리들에게 되묻는다. 결국 김기협의 '엄마 찾기'는 삶에 대한 연민이자 '의미 찾기'인 것이었다.
김기협의 마지막 '엄마 찾기' 작업이 진행 중이다. 법적으로 '계모'로 되어 있는 어머니를 '생모'로 돌려달라는 '친생자관계존부속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어머니에 관한 글을 다시 쓰게 될지도 모른다. 아니, 틀림없이 또 쓰게 될 거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쓰던 것과는 다른 자세로 쓰게 될 것이다. 2년간 적은 글은 어머니의 '인생 강의'를 받아쓴 노트인 셈이다. 이제 노트 필기는 접어놓고, 어머니 얼굴만 기분 좋게 쳐다보며 지내겠다. 언젠가 다음 과목 노트 필기를 시작하게 되겠지만, 서두르지는 않겠다."
이렇게 끝을 맺은 시병 일기의 속편이 나온다면 '생모 찾기' 소송의 결과부터 이야기 하면서 시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남덕 할머니는 이미 그 아들에게 스스로의 방식으로 판결을 내렸다. 2010년 9월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에게 친필로 이렇게 판결문을 적어 주었다.
"아아 나는 너에게 글을 써 주겠다. 너는 내 아들이다. 틀림이 없다. 그런데 한 번도 가까운 데서는 글을 안 써주는구나. 본래 가까운 사람은 항상 먼 데서 멀리 있는 것이로구나."
- 이전글규칙적으로 적당한 운동만 해도 '치매' 예방 11.02.14
- 다음글'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래요 공감합니다 11.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