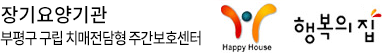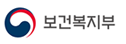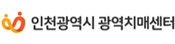나는 피할 수 있을까…‘이들’만 모아도 광역시 된다는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3-16 11:04본문
“현재 국내 치매환자는 70만~80만명인데 2030년엔 100만명, 2040년엔 200만명을 차례로 넘어설 것입니다. 이들만 한 데 모아놔도 광역시 하나가 탄생하는 셈이죠. 치매라는 용어를 바꾸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치매환자가 혼자 거리를 활보해도 별탈없는 사회 안전망이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부가 용어 개정 등 치매관리 강화에 팔을 걷어부친 가운데, 이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찬녕 고대안암병원 신경과 교수가 ‘치매 환자 200만명 시대’에 대비해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성을 강조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교수는 최근 매일경제와 만나 “치매는 생명과 직결된 질환이 아니어서 유병기간이 긴 데다 주변인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노동력 손실이 큰 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치매환자가 혼자 마트를 가고 식당을 가는 등 일상생활을 할 때 큰 문제가 없는 시스템이 미리 구축돼야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찬녕 고대안암병원 신경과 교수는 최근 매일경제와 만나 “치매는 생명과 직결된 질환이 아니어서 유병기간이 긴 데다 주변인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노동력 손실이 큰 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치매환자가 혼자 마트를 가고 식당을 가는 등 일상생활을 할 때 큰 문제가 없는 시스템이 미리 구축돼야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치매는 퇴행성 뇌질환이나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과 판단력이 저하되는 후천적 다발성 장애다. 발병원인 중 절반 이상이 알츠하이머라는 점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초고령 사회에서 치매환자 숫자가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8~10%가 치매를 앓고 있다.
정부는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해 용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매는 과거 일본에서 쓰던 용어를 그대로 들여온 것으로 ‘어리석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지난 1월 복지부는 의료계 등과 치매용어 개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2차 회의는 오는 17일 열린다.
이 교수는 대한치매학회 소속으로 이번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 대한치매학회에선 ‘신경인지증’ 혹은 ‘신경인지병’이 치매를 대체할 용어로 거론되고 있다. 이는 영미권에서 치매를 가리키는 단어인 ‘NCD’(neuro cognitive disorder)를 직역한 형태다.
이 교수는 치매뿐만 아니라 경도인지장애라는 용어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도라는 표현 때문에 환자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고 병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경도인지장애는 치매 초기 단계로 노인인구의 25%가 해당한다”며 “초반일수록 약 효과가 좀 더 잘 발현되는데 환자나 보호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병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치매와 관련한 만병통치약은 없지만 적극 치료하면 이상행동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적으로는 치매 국가책임제와 같은 큰 틀의 관리 시스템이 갖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매 국가책임제란 개별 가정이 아닌 국가가 나서서 돌봄 차원으로 치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치매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교수는 “우리 모두가 10년 혹은 20년 뒤 치매에 충분히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버스나 지하철에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배려석이 있듯 치매환자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며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환자들을 위해 보호자 연락처를 담은 바코드를 옷에 심는 등 실종방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치매환자들이 주로 입원해 있는 요양원 또는 요양병원은 간병인 수가 턱없이 부족해 집단수용시설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며 “치매란 게 1~2년 치료하면 나아지는 병이 아니기에 환자들을 어딘가 가둔다는 것은 적절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용어 개정 등 치매관리 강화에 팔을 걷어부친 가운데, 이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찬녕 고대안암병원 신경과 교수가 ‘치매 환자 200만명 시대’에 대비해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성을 강조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교수는 최근 매일경제와 만나 “치매는 생명과 직결된 질환이 아니어서 유병기간이 긴 데다 주변인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노동력 손실이 큰 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치매환자가 혼자 마트를 가고 식당을 가는 등 일상생활을 할 때 큰 문제가 없는 시스템이 미리 구축돼야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찬녕 고대안암병원 신경과 교수는 최근 매일경제와 만나 “치매는 생명과 직결된 질환이 아니어서 유병기간이 긴 데다 주변인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노동력 손실이 큰 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치매환자가 혼자 마트를 가고 식당을 가는 등 일상생활을 할 때 큰 문제가 없는 시스템이 미리 구축돼야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치매는 퇴행성 뇌질환이나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과 판단력이 저하되는 후천적 다발성 장애다. 발병원인 중 절반 이상이 알츠하이머라는 점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초고령 사회에서 치매환자 숫자가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8~10%가 치매를 앓고 있다.
정부는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해 용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매는 과거 일본에서 쓰던 용어를 그대로 들여온 것으로 ‘어리석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지난 1월 복지부는 의료계 등과 치매용어 개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2차 회의는 오는 17일 열린다.
이 교수는 대한치매학회 소속으로 이번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 대한치매학회에선 ‘신경인지증’ 혹은 ‘신경인지병’이 치매를 대체할 용어로 거론되고 있다. 이는 영미권에서 치매를 가리키는 단어인 ‘NCD’(neuro cognitive disorder)를 직역한 형태다.
이 교수는 치매뿐만 아니라 경도인지장애라는 용어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도라는 표현 때문에 환자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고 병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경도인지장애는 치매 초기 단계로 노인인구의 25%가 해당한다”며 “초반일수록 약 효과가 좀 더 잘 발현되는데 환자나 보호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병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치매와 관련한 만병통치약은 없지만 적극 치료하면 이상행동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적으로는 치매 국가책임제와 같은 큰 틀의 관리 시스템이 갖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매 국가책임제란 개별 가정이 아닌 국가가 나서서 돌봄 차원으로 치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치매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교수는 “우리 모두가 10년 혹은 20년 뒤 치매에 충분히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버스나 지하철에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배려석이 있듯 치매환자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며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환자들을 위해 보호자 연락처를 담은 바코드를 옷에 심는 등 실종방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치매환자들이 주로 입원해 있는 요양원 또는 요양병원은 간병인 수가 턱없이 부족해 집단수용시설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며 “치매란 게 1~2년 치료하면 나아지는 병이 아니기에 환자들을 어딘가 가둔다는 것은 적절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 이전글뼈 튼튼해야 치매 덜 걸린다? ... 뼈에 좋은 음식들 23.03.24
- 다음글중풍환자 보행능력 높이려면...30초 빨리 걷고, 30초 쉬기 반복을 23.03.16